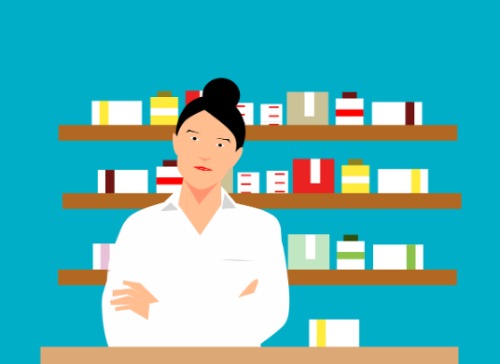티스토리 뷰
1. 서론 – “stability는 검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method의 일상 테스트다”
Bioanalytical validation에서 stability 항목은 흔히 ‘마지막 단계’로 다뤄진다.
정확도, 정밀도, 회수율, selectivity, carry-over 등 주요 항목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bench-top, autosampler, extract, freeze-thaw stability를 수행하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 분석팀 관점에서 보면 stability는
“마지막에 검증하는 항목”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분석의 신뢰도를 증명하는 테스트”다.
특히 extract stability와 bench-top stability는
시료 전처리 및 보관 환경의 미세한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
즉, 안정성 항목은 method의 robustness를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2. Stability 검증 항목의 개념 정리
| Stability 종류 | 평가 시점/환경 | 주요 목적 |
| Bench-top stability | 전처리 전, 실온(benchtop) 상태 보관 중 안정성 | 시료 전처리 지연 시의 영향 평가 |
| Extract stability | 전처리 후, autosampler 상태(4–10°C) 보관 중 안정성 | 분석 시 extract degradation 여부 평가 |
| Freeze-thaw stability | 냉동 ↔ 해동 반복 (≥3 cycles) | sample handling 반복 시 안정성 |
| Long-term stability | 장기 보관 (수일~수개월) | 실제 sample storage 조건 재현 |
| Stock/working solution stability | standard, IS 용액의 보관 안정성 | calibration accuracy 유지 |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오류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건 bench-top stability와 extract stability다.
그 이유는 두 항목 모두 시료 처리 과정의 시간 변수와 온도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3. Bench-top stability – 실온 노출 동안의 함정
Bench-top stability는 nominally “room temperature (~20–25°C)” 조건에서
전처리 전 plasma나 serum 시료를 일정 시간 방치했을 때 analyte가 안정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하지만 이 테스트는 단순히 ‘시간을 재는 실험’이 아니라,
‘시료 내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3.1 흔한 오류 ① – thawing 시간 불일치
validation protocol에는 “bench-top 6시간”이라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QC sample이 완전히 해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운트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 Sample이 -80°C → RT 이동 후 10분 후부터 타이머 시작
- 그러나 내부는 여전히 -10°C 이하
→ 실질적 노출 시간은 protocol 대비 훨씬 짧음
결과: stability pass로 보이지만, 실제 실온 노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해결 전략:
- sample core temperature를 실제 측정 (온도 probe 사용)
- “fully thawed + X시간”을 기준으로 timing 설정
- 해동 중 vortexing 또는 mixing step 명시 (uniform thawing 보장)
3.2 흔한 오류 ② – “실온”의 정의 모호
“room temperature”는 단순히 ‘냉장 아님’이라는 뜻이 아니다.
실험실 환경은 계절에 따라 18°C에서 30°C까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여름철, 국내 실험실에서 air conditioner가 꺼진 주말 동안 시료를 방치하면
실제 온도는 28°C 이상으로 올라가며, 반감기 반 이하로 짧아진 compound도 존재한다.
해결 전략:
- Bench-top stability는 반드시 온도 logging system(예: data logger)과 함께 수행
- “nominal room temperature”가 아니라 “monitored 25±2°C”로 protocol 명시
- 계절별 stability cross-check 수행 (summer vs winter)
3.3 흔한 오류 ③ – matrix 간 stability 차이를 무시
Human plasma로 validation을 완료했더라도,
rat plasma나 mouse plasma에서는 stability failure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species-dependent enzyme activity 차이 때문이다.
예: esterase나 amidase에 의해 hydrolysis가 일어나는 compound
→ human plasma에서는 안정하나, rodent plasma에서는 bench-top 2시간 만에 30% degradation
해결 전략:
- 종(species)별 matrix stability는 반드시 별도로 평가
- 특히 prodrug나 ester계 약물은 plasma enzyme inhibitor (NaF 등) 포함 필요
- matrix별 QC sample 제조 시 동일 donor pool 사용
4. Extract stability – autosampler에서의 ‘숨은 적’
Extract stability는 전처리 후 autosampler (보통 4–10°C) 안에서 일정 시간(24–72시간)
시료가 안정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즉, LC-MS/MS 분석 대기 중 analyte degradation, adsorption, precipitation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4.1 흔한 오류 ① – Autosampler 온도와 실온 혼용
많은 실험실에서 autosampler 온도를 “실온 유지”로 세팅한다.
하지만 validation protocol에는 보통 “4°C에서 48시간”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결국 실제 분석 시에는 20°C, validation 시에는 4°C — 즉, 조건 불일치가 발생한다.
결과:
validation상 안정하더라도, 실제 routine run에서는 analyte loss 발생
→ long batch 분석 시 후반부 QC fail로 이어짐
해결 전략:
- validation과 routine run 조건의 alignment 필수
- autosampler 온도는 실제 운영 환경을 반영
- 장비에 온도 fluctuation alarm 기능 활성화 (±2°C 이상 시 log 기록)
4.2 흔한 오류 ② – Extract 재분석 시 signal drift 누락
autosampler stability를 확인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최초 injection 결과와 stability endpoint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다.
문제는 LC-MS/MS에서 matrix-induced ion suppression이 batch 진행 중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plasma extract는 시간이 지나면 protein precipitation 또는 micro-adsorption이 발생해
MS signal이 서서히 낮아진다.
예시:
Analyte peak area – 초기: 100%, 48시간 후: 87%
IS peak area – 초기: 100%, 48시간 후: 88%
IS-normalized ratio → 0.99 (stable로 판단)
그러나 실제 sample에서는 analyte degradation + IS 동시 loss로 masking된 상황.
해결 전략:
- Absolute peak area 및 IS-normalized ratio 모두 평가
- autosampler stability 중 blank sample contamination check 병행
- 안정성 판단 기준: mean bias ±15% & RSD ≤15%
4.3 흔한 오류 ③ – volatile analyte의 evaporation 손실
LC autosampler vial은 PTFE/silicone septa 구조를 사용하는데,
long-term storage 중 휘발성 compound의 partial evapor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MeOH 함량이 높은 extract는 휘발성이 강해 headspace vaporization이 가속된다.
해결 전략:
- autosampler vial은 crimp cap 또는 screw cap type으로 sealing 강화
- extract solvent의 vapor pressure 고려 (ACN > MeOH > IPA)
- volatile compound의 경우 “dry-down + reconstitution” stability 별도 검증
5. Extract stability 실패 시 진단 포인트
stability failure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불안정하다”로 끝내면 안 된다.
분석팀은 원인 진단을 통해 method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원인 유형 | 징후 | 점검 포인트 |
| 화학적 분해 (hydrolysis, oxidation) | RT shift 없음, peak area 감소 | pH, buffer 조성, antioxidant 필요 |
| 흡착 (adsorption) | peak area 감소, IS 유사 패턴 | vial 재질, injection needle check |
| matrix 재침전 | peak broadening, RT delay | autosampler 온도 낮음, solvent ratio 조정 |
| carry-over contamination | stability sample에 ghost peak | blank injection, valve contamination |
6. Case Study ① – Hydrolysis-sensitive prodrug
Ester 계열 항암 prodrug 분석 중 bench-top stability fail 발생.
6시간 실온 노출 시 nominal conc. 대비 65% recovery로 감소.
LC-MS/MS chromatogram에서는 parent peak 감소, acid metabolite 증가 확인.
원인: plasma esterase에 의한 hydrolysis
대응: NaF (10 mM) 첨가, pH 3 buffer로 sample stabilization
→ stability 24시간까지 연장 성공.
7. Case Study ② – Extract stability during 3-day batch run
anti-inflammatory compound를 autosampler (10°C)에서 72시간 보관 후 분석.
초기 0시간 대비 48시간 이후 QC bias +18%, 72시간 이후 +26%.
IS-normalized ratio도 증가 경향.
원인: solvent evaporation (MeOH-rich extract, PTFE septa vial)
해결: screw cap vial 사용 + reconstitution volume 일정화
→ bias ±7% 이내로 개선.
8. Case Study ③ – Adsorption to polypropylene vial
low concentration (1 ng/mL 이하) 분석 중 extract stability 실패.
analyte의 functional group이 hydrophobic + cationic 성질을 가져
polypropylene 표면에 흡착됨.
초기 100%, 24시간 후 70% signal remaining.
해결: silanized glass vial 전환, 0.1% FA 첨가
→ signal 안정성 48시간 유지.
9. Validation protocol 설계 시 주의점
1️⃣ stability sample은 반드시 independent QC lot 사용
(standard curve preparation과 동일 lot 금지)
2️⃣ storage 시간 동안 sample mixing 조건 동일하게 유지
(standing time vs agitation에 따른 segregation 방지)
3️⃣ freeze-thaw 후 stability 재평가 – extract degradation 복합 효과 확인
4️⃣ re-injection reproducibility와 extract stability를 동시에 수행
→ autosampler drift correction
10. 국내 제약사 실무 사례
| 제약사 | stability 관리 전략 | 비고 |
| 유한양행 | bench-top stability에서 실온 vs 냉장 비교 병행 | sample handling condition 최적화 |
| 종근당 | IS-normalized ratio + absolute peak area 동시 평가 | stability masking 방지 |
| GC녹십자 | vial sealing type별 stability cross-test | evaporation loss 대응 |
이들 기업은 stability를 validation의 “마지막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상용 LC-MS/MS platform 운영 중에도
stability data를 실시간 품질지표(QC metric)로 관리하고 있다.
11. 결론 – “Stability failure는 시료가 아니라,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신호다”
Extract stability와 bench-top stability 실패는 단순히 compound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실험실 시스템 전체 —
전처리, 보관, vial, 온도, matrix — 이 중 하나가 불안정하다는 신호다.
결국 분석 reproducibility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다.
“Stability는 validation 단계가 아니라, 분석팀의 일상 프로세스다.”
- sample thawing, mixing, storage를 protocol보다 정밀하게 통제하라.
- absolute signal과 ratio를 동시에 평가하라.
- 작은 bias라도, 장기적 reproducibility failure의 씨앗으로 본다.
stability는 결국 “시간에 대한 분석의 정직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뢰성, 그게 진짜 bioanalytical method의 완성이다.
'제약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Isotope Tracing 기반 Metabolic Flux 분석 – 종양 대사 재프로그래밍 연구 응용 (0) | 2025.11.18 |
|---|---|
| Proteomics + Metabolomics 통합 분석을 통한 약물 독성 메커니즘 규명 (0) | 2025.11.17 |
| Targeted metabolomics를 이용한 약물 대사 경로 규명 (0) | 2025.11.16 |
| Pharmacometabolomics로 개인 간 약물 반응성 예측 모델 구축하기 (0) | 2025.11.15 |
| ICH M10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대응 – 국내 제약 분석팀 실무 전략 (0) | 2025.11.13 |
| Column aging에 따른 retention shift 관리 – LC-MS/MS 장기 reproducibility 확보 전략 (0) | 2025.11.12 |
| High Matrix Biological Sample에서의 Ion Suppression 원인 분석 및 보정 기법 (0) | 2025.11.11 |
| Mass Spectrometer Tuning과 Ion Source Parameter 최적화로 감도 향상시키기 (0) | 2025.11.10 |
- Total
- Today
- Yesterday
- 대사체 분석
- 머신러닝
- Multi-omics
- 시스템
- 데이터
- audit
- 약물분석
- 미래산업
- 신약 개발
- 제약
- 임상시험
- 디지털헬스케어
- 치료제
- Targeted Metabolomics
- matrix effect
- AI
- 정밀의료
- ich m10
- LC-MS
- metabolomics
- lc-ms/ms
- 약물개발
- 제약산업
- 분석팀
- bioanalysis
- 분석
- 바이오마커
- 신약개발
- 정량분석
- Spatial metabolomics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