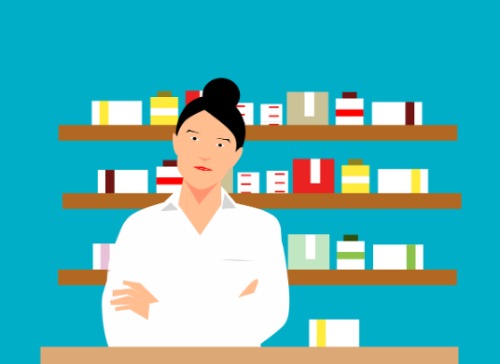티스토리 뷰
–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점
1. 서론: AI와 metabolomics가 바꾸는 제약산업의 미래
최근 10년간 전 세계 제약 산업은 두 가지 거대한 축 위에서 재편되고 있다. 하나는 인공지능(AI) 이고, 다른 하나는 대사체학(Metabolomics) 이다.
AI는 방대한 생명과학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발굴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metabolomics는 생체 내에서 실제 일어나는 대사 변화를 정량적으로 포착함으로써 질병의 기능적 상태를 이해하게 해준다.
국내 제약사들에게 이 두 기술의 융합은 단순한 연구 트렌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미 AI 기반 다중 오믹스(multi-omics) 플랫폼을 신약 개발 전 단계에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제약 산업 역시 데이터 중심 R&D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유한양행 등은 각각의 강점을 기반으로 AI-omics 융합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제 ‘metabolomics–AI’의 결합이 새로운 경쟁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2. Metabolomics의 역할: 생리적 “결과”를 보여주는 오믹스
유전체학(genomics)이나 전사체학(transcriptomics)이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metabolomics는 실제로 일어난 생리적 결과를 보여준다.
즉, 단백질 발현 이후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과 대사 네트워크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질병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약품 개발에 매우 유용하다.
LC-MS/MS 기반 대사체 분석은 수십에서 수백 개의 small molecule을 동시에 정량하며,
이를 통해 약물 대사, 독성, 효능, 부작용 등 실제 환자 반응성을 이해하는 핵심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AI가 해석할 수 있게 되면, 인간이 놓치기 쉬운 미세한 대사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
3.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 데이터 분절과 AI 활용 격차
한국의 제약사는 전통적으로 합성의약품 중심의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이나 시스템 생물학(system biology) 기반의 데이터 통합 역량은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
특히 대사체 데이터는 확보는 되어도 해석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병목이다.
- 문제 1: 실험실 간 데이터 표준화 부족 (샘플 전처리, LC gradient, MS ionization 조건 등)
- 문제 2: 통계적 검증과 생물학적 해석을 연결하는 AI 모델 부족
- 문제 3: multi-omics 통합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및 파이프라인 미비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LC-MS/MS를 이용한 정량 분석은 활발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AI-driven metabolomics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동시에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의 기회이기도 하다.
4. 해외 사례 비교: AI–metabolomics 융합의 산업적 성과
(1) AstraZeneca
AstraZeneca는 Cambridge AI Centre를 통해 LC-MS/MS 기반 대사체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로 해석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특히, 항암제 Olaparib 개발 과정에서 환자의 혈장 대사체와 전사체 데이터를 통합하여 반응성 예측 바이오마커를 도출했다.
이러한 분석은 임상 환자 세분화(stratification)에 활용되었고, 궁극적으로 임상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2) Pfizer
Pfizer는 AI-driven pharmacometabolomics pipeline을 구축하여 항염증제 및 면역항암제 연구에 적용 중이다.
대사체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약물 반응 패턴을 머신러닝으로 분류하고, 임상 시험 디자인 시 “non-responder” 그룹을 조기에 배제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3) Genentech / Roche
Roche는 자사 임상 DB와 multi-omics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해, AI가 자동으로 대사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digital twin 모델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약물 독성 신호를 조기 예측하고, 대사 리프로그래밍 경로를 조정하여 부작용을 줄이는 임상 설계를 추진 중이다.
5. 국내 제약사의 현실적 전략 방향
① 플랫폼 기반 협력 구조 확립
한국 제약사가 개별적으로 AI-metabolomics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엔 리소스 부담이 크다.
따라서 국가 단위 또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형 K-Bio Omics Hub’를 통해 제약사, 병원, CRO, 연구소가 공유 가능한 대사체–임상 데이터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② AI 해석 자동화 알고리즘 개발
국내 AI 스타트업(예: 빅파이프, 스탠다임, 루닛 등)과 협업하여, LC-MS/MS 기반 metabolomics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해석하는 XAI 기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 통계 모델을 넘어 생물학적 경로 기반 해석(biological pathway-based AI)을 도입해야 한다.
③ Multi-omics 통합을 통한 약물 반응성 예측
전사체, 단백체, 대사체 데이터를 함께 통합함으로써 신약후보물질의 실제 효능·독성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때 AI는 이질적 데이터(omics, imaging, EMR 등)를 통합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6. 기술적 세부 전략: LC-MS/MS 데이터와 AI의 결합
(1) 데이터 표준화
- 샘플 전처리, 컬럼, 이온화 조건, 내부표준(IS) 등 모든 분석 과정을 자동 기록 (LIMS 기반 관리)
- raw data를 mzML, mzXML 등 오픈 포맷으로 변환하여 AI 학습 가능 구조로 정리
(2) Feature Engineering & Annotation
- MetaboAnalyst, MS-DIAL, GNPS 등 오픈 툴을 이용해 피크 피처링 및 대사체 annotation 수행
- AI 모델이 구조식, m/z, retention time, intensity 등 다중 변수를 동시에 학습
(3) AI 모델링
- Autoencoder 기반 feature reduction
- Graph neural network(GNN)를 이용한 대사 경로 간 상호작용 학습
- Bayesian optimization을 통한 모델 성능 최적화
(4) Explainable AI (XAI)
- SHAP value, Grad-CAM 등 해석 가능한 AI 기법을 도입해, 어떤 대사체가 특정 약물 반응과 연관되는지 명확히 시각화
7. 항암제 개발에서의 응용 사례
AI–metabolomics 융합 전략은 특히 항암제 분야에서 강력한 잠재력을 보인다.
| 항암제 | 분석 포인트 | 주요 대사체 변화 | AI 예측 응용 |
| Pembrolizumab (PD-1 억제제) | T cell 활성도 예측 | lactate, fumarate | ICI 반응성 예측 |
| 5-FU (항대사제) | 대사경로 리프로그래밍 | thymine, uracil | 내성 예측 |
| Olaparib (PARP 억제제) | NAD+/NADH 비율 변화 | aspartate, malate | DNA repair pathway 예측 |
| Doxorubicin | 미토콘드리아 독성 지표 | acylcarnitine | cardiotoxicity 조기 예측 |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responder vs non-responder”를 구분하거나, 특정 대사경로 활성화 상태에 따라 병용요법을 제안할 수 있다.
8. 국내 제약사별 추진 가능 방향
- 유한양행: global partner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multi-omics 기반 임상환자 분류 연구 추진
- LG화학: 자사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웨어러블, 바이오센서)과 대사체 데이터를 융합해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기반 TDM 플랫폼 구축
- 삼성바이오로직스: CDO/CDMO 단계에서 대사체–단백체 통합 QC 플랫폼 개발, 바이오의약품 배치 품질 예측 AI 모델로 확장 가능
9. 규제 및 산업화 측면
AI–metabolomics 융합이 실제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 FDA 21 CFR Part 11 및 EMA Guideline on Bioanalytical Method Validation 준수
- ICH Q2(R2) 및 Q14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 AI 모델의 검증(Validation of AI algorithm) 절차 명문화
- KFDA(식약처)와 공동으로 “AI 기반 분석법 검증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10. 미래 전망: AI–omics 기반 디지털 트윈 신약개발
궁극적으로, metabolomics–AI 융합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신약개발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다.
즉, 한 환자의 유전체–전사체–단백체–대사체–임상 데이터가 통합되어 “가상의 환자 모델”이 만들어지고,
AI는 그 모델에서 약물 반응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임상 이전에 최적 약물 조합을 예측하게 된다.
국내 제약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단순히 분석 기술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 해석력(data interpretation capability)”을 AI로 강화해야 한다.
즉, AI는 분석의 도구가 아니라, 생물학적 통찰을 도출하는 연구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11. 결론: 한국형 AI–Metabolomics 전략의 청사진
Metabolomics는 신약개발의 “마지막 오믹스”로 불린다.
그 이유는 모든 생물학적 변화가 결국 대사 변화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AI는 이 복잡한 대사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능적 엔진을 제공한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들이 AI–metabolomics 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체계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제는 “실험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결과 해석형 R&D”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 구분 | 핵심 전략 | 기대 효과 |
| 기술적 측면 | LC-MS/MS + AI 통합 파이프라인 구축 | 고감도 정량 및 자동 해석 |
| 산업적 측면 | 제약–IT–병원 협력형 데이터 생태계 조성 | 신약개발 효율 극대화 |
| 규제적 측면 | AI 기반 분석법 검증 가이드라인 수립 | 글로벌 인증 대응 |
| 장기적 비전 | Digital Twin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 개인 맞춤 치료 실현 |
“한국 제약사의 경쟁력은 더 이상 신약 후보 수가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Metabolomics와 AI의 융합은, 그 여정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제약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Total
- Today
- Yesterday
- 약물분석
- bioanalysis
- 시스템
- metabolomics
- 정밀의료
- AI
- Multi-omics
- 바이오마커
- 정량분석
- 대사체 분석
- 제약산업
- Spatial metabolomics
- LC-MS
- 데이터
- 분석
- 치료제
- 제약
- 분석팀
- ich m10
- Targeted Metabolomics
- 신약개발
- lc-ms/ms
- 머신러닝
- 디지털헬스케어
- matrix effect
- audit
- 신약 개발
- 미래산업
- 임상시험
- 약물개발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