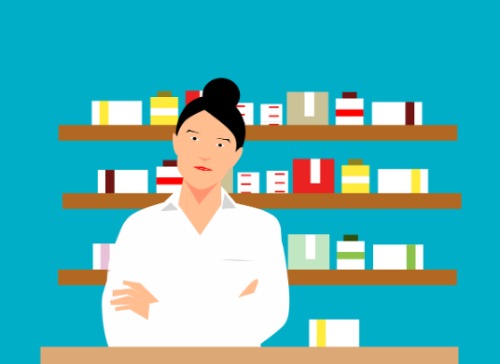티스토리 뷰
임상 시험에서의 Multi-omics Stratification – Responder vs Non-responder 구분 사례
pharma_info 2025. 10. 11. 20:07
서론
신약 개발의 성패는 임상시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신약 후보물질 중 임상 1상에서 출발해 최종적으로 허가까지 도달하는 확률은 10% 미만이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환자별 반응성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크기 때문에 responder와 non-responder 구분에 실패할 경우 임상시험 전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multi-omics 기반 환자군 세분화(stratification) 이다. 즉, 유전체(genome), 전사체(transcriptome), 단백체(proteome), 대사체(metabolome) 데이터를 통합하여 환자의 분자적 특성을 다층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응군(responder)과 비반응군(non-responder)을 미리 구분하는 것이다.
Multi-omics Stratification의 필요성
- 임상시험 실패 요인
- 동일한 치료제라도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배경, 대사 환경, 면역 상태에 따라 반응성이 크게 다름
- 임상 설계에서 이러한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유효성 평가가 왜곡됨
- Stratification의 효과
- responder 그룹만을 선별해 임상에 참여시킴으로써 약물의 통계적 유의성을 강화
- non-responder를 배제하여 불필요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
-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 개발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음
Multi-omics 기반 분석 층위
- Genomics: 특정 유전자 변이(EGFR, KRAS, BRCA 등)와 약물 반응성의 연계
- Transcriptomics: 면역 관련 시그니처(예: IFN-γ signature)와 종양 내 발현 패턴
- Proteomics: 성장인자 수용체 단백질 발현,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 Metabolomics: 글루타민 대사, 젖산 축적, TCA cycle 활성 등 대사 경로 차이
이 데이터를 통합하면 환자의 분자적 지문(molecular fingerprint) 이 도출되고, 이를 기반으로 환자군 분류가 가능하다.
실제 임상 적용 사례
1. 면역관문억제제 (Immune Checkpoint Inhibitor, ICI)
- Responder 특징
- Genomics: 높은 Tumor Mutational Burden (TMB)
- Transcriptomics: PD-L1 발현 증가, IFN-γ 관련 시그니처 강화
- Metabolomics: TCA cycle 대사체 농도 증가 → 활성화된 T cell 기능 지원
- Non-responder 특징
- TCR 다양성 저하
- 종양 미세환경에서 lactate 축적 → T cell 기능 억제
- 특정 면역 억제 단백질 발현 (IDO1, LAG3 등)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임상에서는 면역대사(immunometabolism) 지표 + TCR 다양성을 결합한 복합 바이오마커를 활용하고 있다.
2. EGFR-TKI + 항혈관신생 억제제 병용요법
- Responder 그룹
- EGFR 변이 존재, VEGF 신호 강화
- Metabolomics: 글루타민 사용량 증가 → 세포 성장 억제에 민감
- Non-responder 그룹
- Genomics: c-MET amplification
- Metabolomics: Warburg metabolism 활성 (젖산 대사 강화)
Multi-omics 분석으로 c-MET 변이 보유 환자는 비반응군임을 확인 → 병용요법 제외 대상 선별에 활용.
3. 희귀 대사질환 치료제 임상시험
- Responder
- 치료제 투여 후 urea cycle 대사체 정상화
- 단백체 분석에서 해당 효소의 발현 회복 확인
- Non-responder
- 대사체 교정 불가, 보조 경로 활성화
- 유전자 변이가 특정 효소 불활성화를 야기하여 약물 효과 제한
이러한 분석은 희귀질환 신약의 타깃 환자 선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Stratification Workflow
- 샘플 수집
- 혈액, 종양 조직, 소변, 뇌척수액 등 다중 매트릭스 확보
- 다층 오믹스 데이터 생성
- Genomics: NGS 기반 변이 탐지
- Transcriptomics: RNA-seq
- Proteomics: LC-MS/MS 기반 정량
- Metabolomics: untargeted LC-MS/MS 프로파일링
- 데이터 통합 분석
- 머신러닝 알고리즘(Random Forest, Deep Neural Network 등) 활용
- multi-omics integration 도구(MOFA, iCluster, DIABLO 등) 적용
- 바이오마커 도출 및 검증
- 분자 네트워크 기반 핵심 노드(mTOR, glycolysis hub 등) 탐지
- 독립 코호트에서 재현성 검증
- 임상 반영
- companion diagnostics 키트 개발
- 환자군 맞춤형 임상시험 설계(adaptive clinical trial)
국내외 동향
- 해외
- Broad Institute: pan-cancer multi-omics project → 약물 반응성 예측 모델 구축
- MD Anderson: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multi-omics 기반 환자 stratification 도입
- 유럽 H2020: multi-omics 임상 stratification을 정밀의료 핵심 과제로 추진
- 국내
-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항암제 반응성 평가에 LC-MS/MS 기반 metabolomics 도입
- SK바이오팜: multi-omics + real-world evidence(RWE)를 통합한 임상 전략 수립 중
임상 적용의 의의
- 임상시험 성공률 향상
- 반응군만 선별하여 임상시험 통계적 유효성 강화
- 부작용 감소
- 비반응군 배제를 통해 불필요한 독성 노출 차단
- 시장 경쟁력 강화
- 동반진단 개발을 통한 맞춤형 치료제 상업화
미래 전망
- Single-cell multi-omics: 세포 단위 수준에서 반응성 패턴 해석
- Digital Twin + AI: 환자의 가상 아바타를 만들어 약물 반응 시뮬레이션
- Real-time metabolomics: 환자 모니터링 기반 동적 반응 평가
결론
Multi-omics stratification은 단순히 “효과가 있다/없다”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어떤 환자에게 효과가 있고, 어떤 환자는 배제해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정밀의료의 핵심이다. 면역관문억제제, EGFR-TKI 병용요법,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실제 사례에서도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향후 제약사와 병원은 이를 기반으로 더욱 정밀한 임상시험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제약사들은 LC-MS/MS 기반 metabolomics 기술과 유전체 분석을 융합하여 국내 환자 맞춤형 임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쌓이면,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정밀 임상시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Targeted Metabolomics
- bioanalysis
- 분석팀
- 신약 개발
- Multi-omics
- audit
- AI
- 임상시험
- 디지털헬스케어
- 약물개발
- lc-ms/ms
- LC-MS
- 약물분석
- 데이터
- 분석
- metabolomics
- matrix effect
- 정량분석
- ich m10
- 시스템
- 신약개발
- 머신러닝
- 제약
- 정밀의료
- 미래산업
- 대사체 분석
- 바이오마커
- 제약산업
- 치료제
- Spatial metabolomics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